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은가. 번역서의 경우 번역이 가장 중요하다니.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와 번역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지구 온난화 위기는 조작된 공포다”
“세계 기후 연구의 최전선에 서 있는 어느 기후 과학자의 불편하지만 진솔하고 충격적인 고백!”
이 정도의 문구라면 그 어떤 독자도 혹하지 않을까.
지구 온난화로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
세계에서 4번 째로 작은 섬나라 남태평양 피지에서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투발루가 그 주인공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자 국토를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국가 전체가 이주하기로 결정하는 중대한 사태를 맞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40세 이하까지만 받아들인다고 하니 과거 베트남의 보트 피플 이후 초유의 국가 난민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결과의 희생양이라는,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전 세계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한층 배가될 것이다.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프레온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 환경 자동차에 대한 특혜가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 정상들이 지키지도 않을 환경 보호 서약에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경제 논리’에 의한 것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추운 날씨보다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따뜻한 날씨가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기 1,000년경에는 ‘중세의 최적기’라고 불렸던 기후가 따뜻했던 시기가 있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바로 직전이 1.6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층이 덮여있던 소(小) 빙하기였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추웠다가 오랜 기간 따뜻해진 날씨가 계속되었는데도 아무도 그 때를 ‘온난화 재앙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 이상 고온이 가장 많이 관측되던 때는 최근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1930년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
약 2005년경 데이터를 활용하면 공기분자 10만개당 이산화탄소 분자는 고작 38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인류는 5년마다 10만개의 공기분자 가운데 이산화탄소 분자 한 개정도만 추가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었을까.
2001년 발생했던 911테러는 미국의 무기 생산업자와 중동 지역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처럼, 기후 관련해서는 왜 아무도 그 뒤 배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까.
산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성숙해지면 사업가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라 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게 된다.
사람들의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기와 심각성을 강조함으로써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일례로 70년대 오일 쇼크, 80년대 에너지 위기가 한참 심각할 때 발표되었던 석유 매장량이나 최근 발표된 석유 매장량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석유 매장량에 대해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유는 그 위기감을 통해 새로운 시장-태양광 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석유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이 책을 결론은 따로 있다. 결국 저자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직 책을
읽지 않은 분들 위해 결론은 얘기하지 않으려 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실들 (Facts)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많은 기초 과학 지식을 예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에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읽는 내내 많이 불편했다는 것이다. 머리가 복잡했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글씨 크기나 종이 재질이 아닌 번역 때문이었다. 번역자를 보니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번역하신 분인데, 사실 경제나 과학 같은 전문 서적들은 단순 번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쉽게 풀이해줘야 한다.
나쁜 사마리아 인들을 읽을 때만해도 난 내 머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굳은 줄 알았다.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번역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 더 늘어날 것 같다.
외산 책일 경우에는 번역자가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
Leggie...
'죽기전에 꼭 읽어야 할 책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률사무소 김앤장-대한민국은 누구에 의해 움직이는가 (0) | 2009.10.01 |
|---|---|
| 아르헨티나 할머니-낯설지 않은 첫 만남 (0) | 2009.08.14 |
| 내가 예술 작품이었을 때-낯설음이 주는 즐거움 (0) | 2009.06.23 |
| 갈릴레이 죽이기-팩션, 팩션, 팩션 (0) | 2009.05.12 |
| 열정 바이러스- ‘한 번쯤은’ 보다는 ‘죽을 때까지’가 되길 희망한다 (0) | 2009.05.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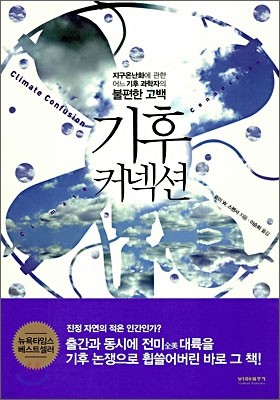



댓글